15번 6. 런던과 라디오.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런던에 있을 때는 라디오를 자주 들었다.
일자리를 구하고 주급을 꼬박꼬박 받던 어느 날, 심하게 오버타임을 해서 통장에 들어온 주급이 심하게 되었던 어느 날,
옥스퍼드 스트릿을 걷다가 D로 시작하는 어떤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갔다. (아 도저히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ㅠㅜ 딕슨이었나 디키였나..)
나는 쏘니에서 나온 15파운드짜리 워크맨을 샀다. 휴대용 카세트/라디오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워크맨이라는 말의 어원이었던 Walkman 이라는 상표가 떡 하니 붙어있는 제품이었다.
그것은 보기에도 내가 즐겨 쓰던 얄쌍한 디쟈인을 뽐내던 20세기 식 워크맨과 는 수준이 다른 워크맨이었다.
튜닝은 돌려서 해야 하고, 단순히 라디오와 테이프재생만 가능한 80년대식 모델이었다. 분명 80년대의 어느 날 그런 모델을 사서 쓰다 친구들 것에 비해 너무 쪽팔려서 가방 안에만 넣고 듣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나는 런던에 살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배낭여행 왔다가 ‘돌아가나 여기 있나 밑바닥인 걸.’ 하고 생각하며 눌러 앉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진 게 배낭 밖에 없었다.
그걸 사는 순간은 처음으로 배낭 이외의 내 물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나는 당장에 집으로 가는 25번 버스를 탔고 스트라트포드까지의 1시간 넘게 걸리는 2층 버스 맨 앞자리에서 워크맨의 포장을 뜯었다.
그날따라 버스 안은 고요했고 질긴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을 아무런 도구 없이 벗겨 내는 건 정말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빡빡한 플라스틱을 벗겨 내는 소리는 버스 안에 묘한 공명을 일으켰다.
그것은 내 생활이 벗겨지는 소리이자 문화가 시작되는 소리였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웬 동양인이 뭘 뜯느라 매너 없이 이상한 소음을 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열어보고 싶은 마음에 멈출 수 없었다.
어쨌든 토튼햄에서 홀본을 지나 방크 쯤 갈 무렵에 간신히 나는 포장을 벗겨내는 데 성공했고 손 한 쪽에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때문에 찰과상이 났다. 그래도 그런 것도 상관없었다.
손에 쥐어 든 워크맨의 감촉은 실로 훌륭했다. 귀에 이어폰을 꽃아 보자 버스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건전지가 없었다. 나는 당장 방크에 내려 건전지를 하나 구입했다. 그리고 꿈에 부풀어 라디오를 켰다. 아아! 돌리는 채널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얼마만에 듣는 음악인가! 그 때 건전지를 사서 끼우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듣던 음악이 아직도 기억에 난다. RASMUS의 in the shadow였다.
어쩐 일인지 다음 25번이 텅 빈 채로 왔다. 나는 음악을 들으며 경쾌하게 패스를 보여주고 버스에 올랐다. 내 삶에 배경음악이 깔리니까 버스 운도 좋아지는구나! 하면서 나는 매우 기뻐했다.
아 그러나 버스가 움직이고 크게 회전을 할 때마다 채널이 바뀌었다. 런던의 라디오 사정이란, 겨우 그 정도였던 것이다. 듣던 음악이 다른 음악으로 바뀌고 이 음악과 저 음악이 섞이고, 이리저리 튜닝을 맞춰보다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다.
뭐가 이래! 15 파운드나 썼는데! 그 시내에서 집 사이의 긴긴 시간을 때우려고 산 건데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나는 정신 산만해서 라디오를 꺼 버렸다. 소리가 사라진 세계에서 지겨운 일상이 잽싸게 파고들어 다시 친한 척을 해댔다.
나는 매우 울고 싶은 심정이 되어버렸다. 어딜 가나 생생하게 나오던 한국의 라디오 사정이 그리웠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물을 마구 들이켰다. 술은 사람을 달아오르게 하고 물은 사람을 가라 앉히지. 라는 왕가위 감독의 동사서독에서 양조위가 때리던 대사를 떠올렸다.
실의에 빠져 있다가 나는 집에서 다시 라디오를 켰다. 침대에 드러누워 베게에 머리를 박고 있다가 혹시나, 하면서 켠 것이었다.
아 그런데 집에서는 라디오 주파수가 바로 옆에서 트는 것처럼 잘 잡혔다. 음악도 생생했고, 볼륨을 너무 올리면 귀가 아플 정도로 출력이 셌다.
우헤헤헤. 하고 나는 웃으며 즐거워했고 일상은 빌어먹을 놈, 하면서 나를 떠나갔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공복감이 그 순간부터 사라져 갔다. 그리고 이 채널 저 채널 돌아가며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어주는 주파수를 찾아 여행했다. 더 이상 밤은 내게 외롭지 않았다.
역시 라디오는 내 친구였어.
나는 매직에펨, 엑스에펨 이런 주파수를 즐겨 들었다. 나는 라디오에서 줄창 락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하지만 울적한 날에는 클래식채널에서 살았고 기분이 좋은 날엔, 팝 채널을 들으며 요리를 하기도 했다.
그래도 역시나 한 시간 넘게 잡아먹던 끔찍한 출퇴근길에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지 못했다. 나는 테이프를 사서 녹음을 해서 들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뭐 15 파운드짜리에 녹음 기능이 있으면 이상하지.
그래서 라디오와 나의 친분은 반쪽짜리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것은 밖에 데리고 나올 수 없는 애인 같아서 길에만 나서면 나를 외롭게 했다.
어느 날 부터 나는 어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기름기를 뒤집어 쓴 라디오가 하나 있었다. 그 라디오는 어떤 채널에 맞춰져 있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설거지를 하며, 아 저 곡이 나오는 걸 보니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는군, 하고 안도하기도 했고 매번 같은 곡의 딱 한 부분만 따라 부르던 주방의 어떤 동료 때문에 혼자 웃기도 했었다. ‘분명 이 노래의 후렴구가 나오면 그 친구가 딱 두 소절만 따라 할 거야.’ 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가 정말로 그가 따라 부르면 나는 이상하게도 그게 웃겼다.
나 역시 당시 유행하던 Dido의 White Flag가 나올 때면 주방일의 바쁨과 고단함에도 결코 백기를 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열심히 따라 불렀다. There will be no white flag above my door ~누구라도 매일 들으면 따라 부를 수 있다. 이 노래는 그 때 하루에 몇 번씩 들을 수 있었다.
도대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곡을 지겹게 선곡하는 방송이 있다니! 그리고 그 선곡은 아주 서서히 표시도 안 나게 바뀐다니!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Evanescence의 Bring Me To Life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던 날 느꼈다.
뭔가 평소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일하자 손발이 안 맞았고 나는 밥을 펑크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곡이 빠진 것이었다. 나는 한참 상실감에 빠져들었었다. 나는 당장 Evanescence 싱글앨범을 사러 갔지만, 밥을 펑크낸 일로 짤린데다가 음반 지를 만한 돈은 없어서 Virgin 레코드에서 씨디를 들었다 놨다만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무렵엔 내게 씨디플레이어가 생겼다. 그 씨디플레이어는 지금도 내 방에 있다.
Packerd Bell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의 제품이었지만 씨디로 구운 MP3까지 재생되면서도 값이 35파운드 정도여서 큰 맘 먹고 질렀던 것 같다. 같은 기능의 쏘니 제품은 70 파운드가 넘었었다. 내 기억엔.
씨디 플레이어가 생긴 뒤로는 한국의 친구들에게 MP3로 구운 씨디를 보내달라고 해서 음악에 대한 원을 풀었다. 씨디 한 장에 레드제플린이나 비틀즈 모든 앨범이 다 들어갔고, 나는 그 뒤로 버스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배경음악이 없거나 시원찮은 영화는 잘 보지 않는다.
음악은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멋있게 만들어 주는 묘한 마력의 결정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귀에 꽃혀 있는 음악들은 한 개인에게 비슷한 배경음악을 부여해 준다. 그런 마력이 더해졌던 한, 내 영국생활은 생생하게 살아서 뭉클거렸다.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는 참 들을만한 음악이 많았다. 모두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고, U2의 노랫말로 어학학원의 수업을 받을 때는 캐감동을 느끼기 까지 했었다.
간만에 그 때 듣던 음악들 위주로 찾아서 이래저래 들어보고 있다. 배경음악이 떠오르자 눈앞에 다시 그 시절, 그 배경이 떠오른다. 좋다. 좋다. 좋다. 라고 세 번 말해본다. 정말 좋다.
일자리를 구하고 주급을 꼬박꼬박 받던 어느 날, 심하게 오버타임을 해서 통장에 들어온 주급이 심하게 되었던 어느 날,
옥스퍼드 스트릿을 걷다가 D로 시작하는 어떤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갔다. (아 도저히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ㅠㅜ 딕슨이었나 디키였나..)
나는 쏘니에서 나온 15파운드짜리 워크맨을 샀다. 휴대용 카세트/라디오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워크맨이라는 말의 어원이었던 Walkman 이라는 상표가 떡 하니 붙어있는 제품이었다.
그것은 보기에도 내가 즐겨 쓰던 얄쌍한 디쟈인을 뽐내던 20세기 식 워크맨과 는 수준이 다른 워크맨이었다.
튜닝은 돌려서 해야 하고, 단순히 라디오와 테이프재생만 가능한 80년대식 모델이었다. 분명 80년대의 어느 날 그런 모델을 사서 쓰다 친구들 것에 비해 너무 쪽팔려서 가방 안에만 넣고 듣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나는 런던에 살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배낭여행 왔다가 ‘돌아가나 여기 있나 밑바닥인 걸.’ 하고 생각하며 눌러 앉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진 게 배낭 밖에 없었다.
그걸 사는 순간은 처음으로 배낭 이외의 내 물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나는 당장에 집으로 가는 25번 버스를 탔고 스트라트포드까지의 1시간 넘게 걸리는 2층 버스 맨 앞자리에서 워크맨의 포장을 뜯었다.
그날따라 버스 안은 고요했고 질긴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을 아무런 도구 없이 벗겨 내는 건 정말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빡빡한 플라스틱을 벗겨 내는 소리는 버스 안에 묘한 공명을 일으켰다.
그것은 내 생활이 벗겨지는 소리이자 문화가 시작되는 소리였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웬 동양인이 뭘 뜯느라 매너 없이 이상한 소음을 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열어보고 싶은 마음에 멈출 수 없었다.
어쨌든 토튼햄에서 홀본을 지나 방크 쯤 갈 무렵에 간신히 나는 포장을 벗겨내는 데 성공했고 손 한 쪽에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때문에 찰과상이 났다. 그래도 그런 것도 상관없었다.
손에 쥐어 든 워크맨의 감촉은 실로 훌륭했다. 귀에 이어폰을 꽃아 보자 버스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건전지가 없었다. 나는 당장 방크에 내려 건전지를 하나 구입했다. 그리고 꿈에 부풀어 라디오를 켰다. 아아! 돌리는 채널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얼마만에 듣는 음악인가! 그 때 건전지를 사서 끼우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듣던 음악이 아직도 기억에 난다. RASMUS의 in the shadow였다.
어쩐 일인지 다음 25번이 텅 빈 채로 왔다. 나는 음악을 들으며 경쾌하게 패스를 보여주고 버스에 올랐다. 내 삶에 배경음악이 깔리니까 버스 운도 좋아지는구나! 하면서 나는 매우 기뻐했다.
아 그러나 버스가 움직이고 크게 회전을 할 때마다 채널이 바뀌었다. 런던의 라디오 사정이란, 겨우 그 정도였던 것이다. 듣던 음악이 다른 음악으로 바뀌고 이 음악과 저 음악이 섞이고, 이리저리 튜닝을 맞춰보다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다.
뭐가 이래! 15 파운드나 썼는데! 그 시내에서 집 사이의 긴긴 시간을 때우려고 산 건데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나는 정신 산만해서 라디오를 꺼 버렸다. 소리가 사라진 세계에서 지겨운 일상이 잽싸게 파고들어 다시 친한 척을 해댔다.
나는 매우 울고 싶은 심정이 되어버렸다. 어딜 가나 생생하게 나오던 한국의 라디오 사정이 그리웠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물을 마구 들이켰다. 술은 사람을 달아오르게 하고 물은 사람을 가라 앉히지. 라는 왕가위 감독의 동사서독에서 양조위가 때리던 대사를 떠올렸다.
실의에 빠져 있다가 나는 집에서 다시 라디오를 켰다. 침대에 드러누워 베게에 머리를 박고 있다가 혹시나, 하면서 켠 것이었다.
아 그런데 집에서는 라디오 주파수가 바로 옆에서 트는 것처럼 잘 잡혔다. 음악도 생생했고, 볼륨을 너무 올리면 귀가 아플 정도로 출력이 셌다.
우헤헤헤. 하고 나는 웃으며 즐거워했고 일상은 빌어먹을 놈, 하면서 나를 떠나갔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공복감이 그 순간부터 사라져 갔다. 그리고 이 채널 저 채널 돌아가며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어주는 주파수를 찾아 여행했다. 더 이상 밤은 내게 외롭지 않았다.
역시 라디오는 내 친구였어.
나는 매직에펨, 엑스에펨 이런 주파수를 즐겨 들었다. 나는 라디오에서 줄창 락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하지만 울적한 날에는 클래식채널에서 살았고 기분이 좋은 날엔, 팝 채널을 들으며 요리를 하기도 했다.
그래도 역시나 한 시간 넘게 잡아먹던 끔찍한 출퇴근길에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지 못했다. 나는 테이프를 사서 녹음을 해서 들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뭐 15 파운드짜리에 녹음 기능이 있으면 이상하지.
그래서 라디오와 나의 친분은 반쪽짜리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것은 밖에 데리고 나올 수 없는 애인 같아서 길에만 나서면 나를 외롭게 했다.
어느 날 부터 나는 어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기름기를 뒤집어 쓴 라디오가 하나 있었다. 그 라디오는 어떤 채널에 맞춰져 있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설거지를 하며, 아 저 곡이 나오는 걸 보니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는군, 하고 안도하기도 했고 매번 같은 곡의 딱 한 부분만 따라 부르던 주방의 어떤 동료 때문에 혼자 웃기도 했었다. ‘분명 이 노래의 후렴구가 나오면 그 친구가 딱 두 소절만 따라 할 거야.’ 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가 정말로 그가 따라 부르면 나는 이상하게도 그게 웃겼다.
나 역시 당시 유행하던 Dido의 White Flag가 나올 때면 주방일의 바쁨과 고단함에도 결코 백기를 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열심히 따라 불렀다. There will be no white flag above my door ~누구라도 매일 들으면 따라 부를 수 있다. 이 노래는 그 때 하루에 몇 번씩 들을 수 있었다.
도대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곡을 지겹게 선곡하는 방송이 있다니! 그리고 그 선곡은 아주 서서히 표시도 안 나게 바뀐다니!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Evanescence의 Bring Me To Life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던 날 느꼈다.
뭔가 평소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일하자 손발이 안 맞았고 나는 밥을 펑크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곡이 빠진 것이었다. 나는 한참 상실감에 빠져들었었다. 나는 당장 Evanescence 싱글앨범을 사러 갔지만, 밥을 펑크낸 일로 짤린데다가 음반 지를 만한 돈은 없어서 Virgin 레코드에서 씨디를 들었다 놨다만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무렵엔 내게 씨디플레이어가 생겼다. 그 씨디플레이어는 지금도 내 방에 있다.
Packerd Bell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의 제품이었지만 씨디로 구운 MP3까지 재생되면서도 값이 35파운드 정도여서 큰 맘 먹고 질렀던 것 같다. 같은 기능의 쏘니 제품은 70 파운드가 넘었었다. 내 기억엔.
씨디 플레이어가 생긴 뒤로는 한국의 친구들에게 MP3로 구운 씨디를 보내달라고 해서 음악에 대한 원을 풀었다. 씨디 한 장에 레드제플린이나 비틀즈 모든 앨범이 다 들어갔고, 나는 그 뒤로 버스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배경음악이 없거나 시원찮은 영화는 잘 보지 않는다.
음악은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멋있게 만들어 주는 묘한 마력의 결정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귀에 꽃혀 있는 음악들은 한 개인에게 비슷한 배경음악을 부여해 준다. 그런 마력이 더해졌던 한, 내 영국생활은 생생하게 살아서 뭉클거렸다.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는 참 들을만한 음악이 많았다. 모두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고, U2의 노랫말로 어학학원의 수업을 받을 때는 캐감동을 느끼기 까지 했었다.
간만에 그 때 듣던 음악들 위주로 찾아서 이래저래 들어보고 있다. 배경음악이 떠오르자 눈앞에 다시 그 시절, 그 배경이 떠오른다. 좋다. 좋다. 좋다. 라고 세 번 말해본다. 정말 좋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mandu님의 댓글
mandu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Dixons입니다. ㅋㅋ
카페에 올리시는 글도 같이 올리시는건 어떠신지요?
개인적으로 영국일기에 쓰시는 일기 형식의 글을 좋아합니다..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저도 라디오 꽤 들었었는데.. 특히 기숙사 생활할때 식당에 항상 라디오를 틀어놨었거든요. East Sussex에서 살땐 Southern FM, Kent에서 살땐 Medway FM을 주로 들었어요. ^^
2525님의 댓글
2525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x-FM을 주말에는 하루종일 틀어놨는데 같이사는 동갑내기 외국인 친구가
야 그건 고등학생용이야. 하길래. 비웃었죠.
그리고 갑자기 라디오에서 청취자랑 디제이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숙제는 했냐고 물어보는데-_-;;;;
당황.
15번진짜안와님의 댓글
아...역시 내 정신연령은 고딩 수준이 맞았어..ㅠㅜ
영국안사랑님의 댓글
영국안사랑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전 매에~~직! 원오화이~ㅂ포포인 포~~
Virginmedia님의 댓글
매직 FM강추요~ 30대 직딩분이시라면 정말 강추~ 매일 들어요. 105.4. Angie Grea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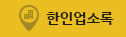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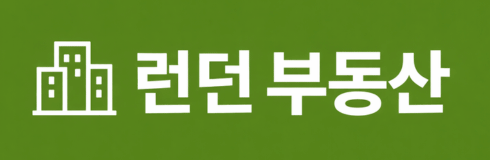


 내가 쓴 글 보기
내가 쓴 글 보기



